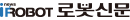내년에 화재·폭발성 환경 Ex 인증 받은 애니멀 X 출시···지금까지 2120억원 유치

스위스 애니보틱스가 클라이미트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더플레이 텍 슬롯리포트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로써 이 회사의 총 투자 유치 규모는 1억 5000만달러(약 2120억원)가 넘었다.
애니보틱스는 산업용 4족보행 자율검사 플레이 텍 슬롯을 제공한다.
펠리시티 오켈리 클라이미트 인베스트먼트(CI)의 투자 이사는 “애니보틱스의 기술은 산업 검사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애니멀은 최첨단 로봇 기술을 산업 분야에 도입함으로써 운영자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운영 탄력성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이 최우선인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투자는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려는 CI의 사명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애니보틱스는 이 이동 플레이 텍 슬롯을 통해 자산 성능, 안전성 및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애니멀이 장비 과열, 비정상적인 진동, 누출 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식별해 자산 성능 저하 및 잠재적 고장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니보틱스에 따르면 애니멀 D는 이미 매주 수천 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취리히에 본사를 둔 애니보틱스는 이 시스템이 인간 검사관에게 위험한 지역에서 작동하며 원격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자사 플레이 텍 슬롯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스택이 완전 자율 주행, 충돌 회피, 계단 오르기 기능을 지원해 이 플레이 텍 슬롯을 복잡하고 멀리 떨어진 산업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폭발 위험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애니멀 X
애니보틱스는 위험하고 폭발 위험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Ex 인증을 받은 보행 플레이 텍 슬롯인 애니멀 X의 고객 인도를 준비 중이다.
애니멀 X는 CI의 투자 및 구축 지원을 바탕으로 내년에 출시돼 폭발 위험 지역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애니보틱스는 이번 투자금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확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새로운 애니멀용 가스 누출 및 존재 감지 기능을 출시했다. 애니보틱스는 자사의 통합 가스 감지기와 음향 이미징 탑재 장치를 통해 누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변 가스 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니보틱스, CI 파트너들과 협력
CI는 복잡한 산업 환경에서 탈탄소화 기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 투자 기업이다. 석유 및 가스 기후 이니셔티브(OGCI) 회원사들이 이 조직을 설립했다. OGCI에는 아람코, BP, 셰브론, 엑슨모바일 및 기타 석유 및 가스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CI가 업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애니보틱스는 이미 에퀴노어, ENI, 페트로브라스를 포함한 여러 CI 파트너사들과 SLB, 지멘스 에너지, 지멘스 AG, GE 버노바, 노벨리스, 오우토쿰푸, AWS, SAP, 요코가와, 엔비디아 등의 고객 및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다.
애니보틱스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페터 판크하우저 박사는 “CI를 우리 투자 그룹에 영입하게 돼 매우 기쁘다. CI가 보유한 심층적인 산업 전문성과 강력한 산업 파트너들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고 전 세계 고객에게 자율 로봇 검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투자 사례 중 하나는 에퀴노어, 토털에너지스, 셸이 합작 투자한 회사인 노르웨이 노던 라이츠(Northern Lights)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시설이다. 평소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 시설에서 자율 작동하는 애니멀 플레이 텍 슬롯은 빈번한 검사 수행 외에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모니터링한다.
애니보틱스 측은 이 플레이 텍 슬롯이 운영자에게 자동 분석 및 이상 보고를 해 안전성, 가동 시간, 자산 무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애니보틱스의 기존 투자자로는 NGP 캐피털, 아람코 벤처스, 베세머 벤처 파트너스, 퀄컴 벤처스 등이 있다.
이재구 기자 robot3@irobotnews.com